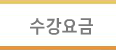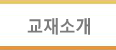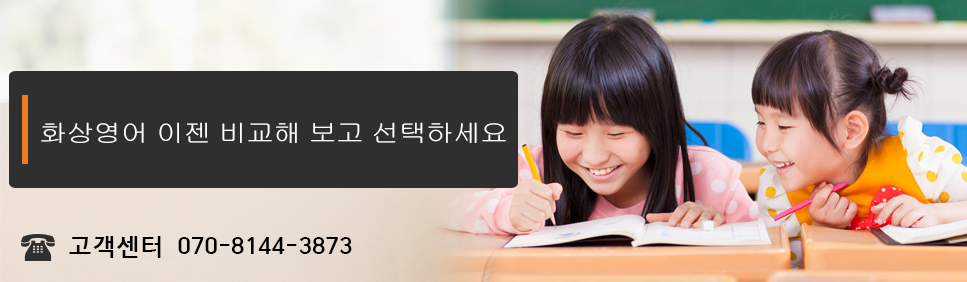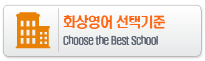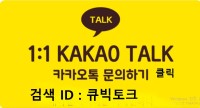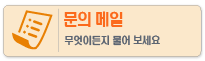바다이야기예시 ∮ 28.rec131.top ∮ 야마토 동영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남수래 작성일25-05-14 06:3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97.rnt829.top
4회 연결
http://97.rnt829.top
4회 연결
-
 http://77.rzz861.top
4회 연결
http://77.rzz861.top
4회 연결
본문
【57.rec131.top】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39개 기업 중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케 자동차유지비가격 하는 '전문성'에 있어선 부족함이 엿보였습니다.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구축한 기업 중 52%만이 이사회나 경영진이 기후변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CDP는 “글로벌 기업의 평균인 87%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미소금융지점
국내 기업들의 87%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고, 71%가 '이중 중대성 식별 및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리스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당장의 태풍이나 폭염과 같은 단기적이고도 물리적인 리스크부터 기온, 해수온의 상승 등 장기적인 물리적 리스크, 탄소가격이나 국내 8호선 연장 법제도의 변화 등 소위 '전환 리스크'로 불리는 리스크 외에도 시장과 기술의 변화, 기업의 평판을 비롯해 법적인 책임까지 다양합니다. 이들 리스크는 기업의 매출, 직접 운영비뿐 아니라 자본지출이나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리스크 식별 수준은 글로벌 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장대출사기 이에 63%가 기후전환 계획을 수립했고, 72%가 공급망에 얽힌 협력사들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91%가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전, “애플이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한다”는 식의 보도가 잇따랐던 것처럼, 이젠 한국 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을 관리하고 나선 겁니다.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이 실천의 기틀이라면, 실제 행동과 그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기업들의 배출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CDP는 〈CDP 기후변화 및 물 리포트 2024-한국〉 보고서에서 국내 234개 기업의 2024년 배출량을 분석했는데, 이들 중 5개년 연속으로 배출량을 CDP에 보고한 기업 62곳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62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2억 1,428만톤에서 2024년 2억 470만톤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사업장 내의 직접 배출량을 의미하는 Scope 1 배출이 1억 6,604만톤에서 1억 5,194만톤으로 8.5% 감소한 덕분입니다. 반면, 이들 기업의 전력사용에서 비롯된 배출량인 Scope 2 배출은 4,824만톤에서 5,276만톤으로 9.4% 늘었습니다. 더도 말고, 기업이 직접 생산공정의 효율 개선 등의 노력으로 Scope 1을 줄인 만큼만이라도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더해져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낮아졌다면, 2024년 이들 기업의 배출량은 2억 21만톤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들 기업 62곳의 업종별 배출량은 어땠을까. 원자재와 산업재,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부문의 경우 Scope 1의 배출이 Scope 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중공업 등 업의 특성상 해당 기업의 사업장 내에서 직접적인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통 업종들로, 특히 원자재 분야 기업의 Scope 1 배출은 절대적인 양 또한 1억 610만톤으로 많아 전체 62개 기업 Scope 1과 2 배출 총합의 51.8%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소위 '미래 먹거리'로 분리는 IT 등 기타 업종들입니다. 반도체 등 IT 업종과 전자제품, 자동차 등 선택소비재, 그 외 통신과 금융, 필수소비재 부문 기업의 배출에 있어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의 최소 3배에서 최대 52배에 달했습니다. 아무리 기업 스스로 감축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들이 끌어다 쓰는 전력이 청정화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한 일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수출 경쟁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온실가스 감축'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업종은 생산시설을 무탄소 전원의 수급이 용이한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지 중 하나로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산업계의 감축에 있어 국가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핵심 요소이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인구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우리의 밀도는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나라임에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원자력 발전량이 많고, 8번째로 석탄화력 발전량이 많고, 9번째로 천연가스 발전량이 많고, 10번째로 태양광 발전량이 많습니다. 주요 발전원 5종 중 4종에 있어 '글로벌 Top 10'에 드는 것이죠. 지난 연재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인구당 발전량으로 봤을 때에도 원자력(3,649kWh/명)은 세계 4위, 석탄은 세계 5위(3,623kWh/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면적 대비 얼마나 많은 발전설비가 모여있는 것일까.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Top 10 국가의 발전량을 그 나라의 면적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면적은 국토부와 유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Top 10에 든 석탄과 천연가스, 원자력에 있어 '압도적 밀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발전원은 원자력으로, 1,000ha당 1만 9,365MWh의 전력을 생산해 절대적인 발전량 세계 1, 2위인 미국(연간 총 782TWh, 885MWh/1,000ha)과 중국(연간 총 445TWh, 472MWh/1,000ha)은 물론, 연간 원자력 발전량 상위 10개국 중 한국 다음으로 면적당 발전량이 많은 프랑스(연간 총 379TWh, 6,922MWh/1,000ha)와도 비교가 어려울 정돕니다.
석탄 또한 1,000ha당 19,160MW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세계에서 연간 1,000TWh 이상의 석탄발 전력을생산중인 '유이한' 나라인 중국(연간 총 5,864TWh, 6,222MWh/1,000ha)과 인도(연간 총 1,534TWh, 5,159MWh/1,000ha)는 물론, 이웃 나라인 일본(연간 총 326TWh, 8,944MWh/1,000ha)의 배를 넘습니다. 국토 1,000ha당 1만 8,238MWh의 전력을 생산한 가스화력발전의 밀도 또한 압도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천연가스 발전량 상위 10개국 중 면적당 발전량 2위의 일본(연간 총 347TWh, 9,520MWh/1,000ha)의 배에 가깝고, 자국 내에서 직접 가스를 생산하는 미국(연간 총 1,865TWh, 2,039MWh/1,000ha)과 러시아(연간 총 538TWh, 329MWh/1,000ha)는 물론, 이란(연간 총 311TWh, 1,917MWh/1,000ha)과 사우디(연간 총 265TWh, 1,233MWh/1,000ha)보다도 크게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의 밀도 또한 1,000ha당 3,381MWh로 연간 발전량 상위 10개국 중 가장 컸지만, 그나마 다른 전통 발전원에 비해선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작았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의 '고밀도'를 보이는 일본은 지난해 1,000ha당 2,798MWh의 전력을 생산해 이들 10개 국가 중 '밀도 2위'를 기록했고, 독일(2,032MWh/1,000ha)과 이탈리아(1,181MWh/1,000ha), 스페인(1,181MWh/1,000ha)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한된 자금과 제한된 땅, 그리고 제한된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화석연료의 밀도를 낮추고, 무탄소 발전원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해마다 발전량은 상황에 따라 증감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향성은 분명합니다. 바로, 발전원에 있어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화석연료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최근 15년간 주요 발전원별 전년 대비 발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석탄과 천연가스 발 전력생산의 성장세는 꺾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발전량 변화가 음수를 기록한 경우도 있을뿐더러,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더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원자력의 경우,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면서 성장세에 있어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존 전통 발전원과 달리 해마다 성장세가 커졌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값이 '양수'라는 것 자체가 '전년보다 발전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증가폭이 갈수록 커진 것이죠.
Ember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발전량의 변화폭이 컸던 10개 나라를 추렸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줄어드는 것도 함께 살펴본 겁니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중국(+110TWh)과 인도(+63TWh)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화폭이 컸던 곳은 미국으로, 발전량은 전년 대비 22.4TWh 감소했습니다. 한국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석탄 발 전력 생산은 17.7TWh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고요. 한편, 석탄 발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미국이지만, '본격적인 탈화석연료에 나섰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천연가스 발 전력 생산에 있어 미국은 2024년, 전년 대비 59T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며 세계에서 가스화력발전의 변화량이 가장 큰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변동폭이 컸던 나라로는 이집트(+15.1TWh)와 멕시코(+14.8TWh)뿐 아니라, 영국(-13.8TWh), 이란(-12.8TWh), 스페인(-12TWh) 등 발전량이 줄어든 곳들도 있었습니다.
무탄소 발전원의 경우는 어땠을까. 우선 원자력의 경우 가장 큰 폭의 변화량을 기록한 곳은 프랑스(+41TWh)였습니다. 이어 중국(+10.4TWh)과 한국(+8.2TWh), 일본(+7.4TWh) 순으로 변화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이 마무리되며 발전량이 전년 대비 7.2TWh 감소했고, 미국은 전년 대비 7.1TWh 늘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중국과 미국, 브라질이 성장세를 이끈 트로이카로 꼽혔습니다. 중국의 2024년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대비 250TWh 늘었고, 미국은 64TWh, 브라질은 23TWh 증가했습니다. 풍력의 경우, 중국 106TWh, 미국 32TWh, 브라질 12.3TWh의 증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발전원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태양광발전에 있어 최근 5년간 개별 국가별로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지난해 기준, 연간 최소 20TWh 넘는 전력을 햇빛으로 만들어낸 전 세계 15개국의 변화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소위 '탑 티어'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량 100TWh초과국으로는 중국과 미국, 인도,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2019년에도, 2024년에도 절대적인 발전량 기준으로는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4개국 중 발전량은 가장 적지만, 2024년 태양광 단일 발전원의 발전비중이 9.98%로 10분의 1에 달해 중국(8.28%), 미국(6.91%), 인도(6.5%)를 앞섰습니다.
2024년 기준 태양광 발전량이 50TWh를넘지만 아직 세 자릿수를 기록하진 못한 나라로는 브라질과 독일, 그리고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절대량 자체는 앞선 '탑 티어' 국가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자국 내 발전비중에 있어선 태양광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2019년만 해도 연간 6.65TWh의 태양광 발전량으로 발전비중 1.05%에 그쳤던 브라질은 2024년 74.68TWh로 그 양이 11배가 되면서 10.02%의 발전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의 태양광 발전비중은 2019년 7.54%로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2024년엔 14.89%로 더 높아졌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2024년 기준 연간 발전량은 58.6TWh로 브라질이나 독일보다 적었지만, 발전비중은 20.9%로 두 나라를 압도했습니다.
20TWh 선을 넘은 국가로는 호주(49.84TWh)와 이탈리아(35.81TWh), 한국(32.73TWh), 멕시코(27.55TWh), 베트남(25.85TWh), 튀르키예(25.67TWh), 프랑스(23.57TWh), 그리고 네덜란드(21.65TWh)가 있습니다. 이들 8개국 중 2024년 태양광의 발전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2019년 6.88%였던 비중은 5년 후 17.81%로 높아졌죠. 네덜란드 또한 4.5%에서 17.7%로 8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베트남(8.54%)과 튀르키예(7.52%)의 경우, 개도국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비중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4.23%)와 한국(5.26%)은 위 그래프에 담긴 15개국들 중 가장 낮은 발전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는 발전믹스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과의 대결구도를 내세우며 반박할 여지는 없습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Top10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1위, 782TWh)과 중국(2위, 445TWh), 일본(7위, 85TWh), 인도(8위, 55TWh), 스페인(9위, 55TWh)도 한국보다 더 많은 태양광 발전량과 더 큰 태양광 발전비중을 기록중이니까요. '국토 면적이 비좁으니까'라는 핑계 또한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면적당 발전량은 석탄도, 천연가스도, 원자력도 주요 선진국 또는 개도국 대비 '압도적 1위'로 높은 밀도를 자랑하고 있고, 그나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밀도는 그나마 '덜 압도적인 1위'인 상태니까요.
무의미하고도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논쟁은 젖혀두고, 모두가 함께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유연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력 수요에 공급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맞출 것인가, 수요의 지나친 변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가격 신호를 이용한 가장 원초적인 수급 조절부터 DR(Demand Response, 수요 반응)과 같은 좀 더 세련된 정책적인 대응과 양수, BESS, 플라이휠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유연성 자원의 투입, 고도화한 관측장비와 AI 기술을 접목한 모델링 설계를 통한 수요 및 공급 예측의 속도와 정확도 개선 등 실체적인 '행동'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바다이야기예시 ∮ 44.rec131.top ∮ 야마토 동영상
바다이야기예시 ∮ 79.rec131.top ∮ 야마토 동영상
바다이야기예시 ∮ 60.rec131.top ∮ 야마토 동영상
바다이야기예시 ∮ 80.rec131.top ∮ 야마토 동영상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황금성후기 캡틴프라이드게임 블랙잭추천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파친코게임 바다이야기코드 스위피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꽁머니릴게임 잭팟 온라인파칭코 뽀빠이놀이터 바다이야기게임공략방법 황금포커성 인터넷게임사이트 무료슬롯게임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일본 야마토 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야마토온라인주소 부산야마토 카지노 슬롯 게임 추천 프라그마틱환수율 릴게임 백경 황금성게임공략법 뽀빠이릴게임 슬롯릴게임 신야마토 오리지널황금성3게임 체리게임주소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pc야마토게임 카지노 슬롯머신 전략 스위피릴게임 10원 야마토게임 인터넷바다이야기게임 무료황금성 게임몰 릴게임 알라딘 릴게임 모바일릴게임 바다이야기게임장 오션파라다이스7 모바일야마토 바다이야기 부활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야마토게임 방법 릴게임알라딘 골드몽릴게임 바다이야기무료 블랙잭추천 릴게임갓 무료 릴게임 최신 인터넷게임 오션파라다이스3 오션슬롯 신 천지 게임 황금포카성 바다이야기 도박 파친코 바다이야기게임하기 파친코게임 오션슬롯 먹튀 릴게임 무료머니 황금성게임동영상 무료 충전 바다이야기 황금성게임앱 캡틴프라이드게임 야마토게임기 황금성게임공략 법 바다이야기넥슨 릴게임종류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바다이야기 5만 야마토3게임 다운로드 하기 릴114 릴게임주소 야마토2게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오리지널황금성 프라그마틱 무료스핀 슬롯머신추천 온라인야마토 PC 슬롯 머신 게임 바다이야기 확률 바다이야기게임 황금성 게임랜드 바다신2다운로드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릴게임꽁머니 릴게임추천사이트 상품권릴게임 바다 이야기 다운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바다이야기규칙 릴게임다운로드 알라딘사이트 바다이야기릴게임사이트추천및안내 알라딘릴게임 사이트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바다이야기하는법 체리 마스터 pc 용 릴게임이란 무료 릴게임 백경게임랜드 프라그마틱 슬롯 하는법 슬롯머신 프로그램 한국파칭코 릴게임동영상 사설경정 알라딘게임 바다이야기 5만 릴게임 신천지사이트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바다 이야기 다운 릴게임알라딘주소 유희왕황금성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최신야마토 해외축구일정 야마토오락실게임 오션파라 다이스다운로드 릴황금성 야마토온라인주소 사이트추천 해저이야기사이트 한때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어젠다를 외면했던, 그래서 그저 기부금 공여나 캠페인 실시처럼 이를 '남의 일 돕듯' 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기후변화 그 자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나 국가, 지자체, 그리고 시장의 노력은 이 그룹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그룹은 기후변화와 그 대응에 '가장 민감한 그룹'으로 변모했습니다. 바로, 산업계의 이야기입니다.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39개 기업 중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케 자동차유지비가격 하는 '전문성'에 있어선 부족함이 엿보였습니다.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구축한 기업 중 52%만이 이사회나 경영진이 기후변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CDP는 “글로벌 기업의 평균인 87%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미소금융지점
국내 기업들의 87%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고, 71%가 '이중 중대성 식별 및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리스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당장의 태풍이나 폭염과 같은 단기적이고도 물리적인 리스크부터 기온, 해수온의 상승 등 장기적인 물리적 리스크, 탄소가격이나 국내 8호선 연장 법제도의 변화 등 소위 '전환 리스크'로 불리는 리스크 외에도 시장과 기술의 변화, 기업의 평판을 비롯해 법적인 책임까지 다양합니다. 이들 리스크는 기업의 매출, 직접 운영비뿐 아니라 자본지출이나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리스크 식별 수준은 글로벌 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장대출사기 이에 63%가 기후전환 계획을 수립했고, 72%가 공급망에 얽힌 협력사들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91%가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전, “애플이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한다”는 식의 보도가 잇따랐던 것처럼, 이젠 한국 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을 관리하고 나선 겁니다.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이 실천의 기틀이라면, 실제 행동과 그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기업들의 배출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CDP는 〈CDP 기후변화 및 물 리포트 2024-한국〉 보고서에서 국내 234개 기업의 2024년 배출량을 분석했는데, 이들 중 5개년 연속으로 배출량을 CDP에 보고한 기업 62곳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62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2억 1,428만톤에서 2024년 2억 470만톤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사업장 내의 직접 배출량을 의미하는 Scope 1 배출이 1억 6,604만톤에서 1억 5,194만톤으로 8.5% 감소한 덕분입니다. 반면, 이들 기업의 전력사용에서 비롯된 배출량인 Scope 2 배출은 4,824만톤에서 5,276만톤으로 9.4% 늘었습니다. 더도 말고, 기업이 직접 생산공정의 효율 개선 등의 노력으로 Scope 1을 줄인 만큼만이라도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더해져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낮아졌다면, 2024년 이들 기업의 배출량은 2억 21만톤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들 기업 62곳의 업종별 배출량은 어땠을까. 원자재와 산업재,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부문의 경우 Scope 1의 배출이 Scope 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중공업 등 업의 특성상 해당 기업의 사업장 내에서 직접적인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통 업종들로, 특히 원자재 분야 기업의 Scope 1 배출은 절대적인 양 또한 1억 610만톤으로 많아 전체 62개 기업 Scope 1과 2 배출 총합의 51.8%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소위 '미래 먹거리'로 분리는 IT 등 기타 업종들입니다. 반도체 등 IT 업종과 전자제품, 자동차 등 선택소비재, 그 외 통신과 금융, 필수소비재 부문 기업의 배출에 있어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의 최소 3배에서 최대 52배에 달했습니다. 아무리 기업 스스로 감축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들이 끌어다 쓰는 전력이 청정화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한 일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수출 경쟁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온실가스 감축'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업종은 생산시설을 무탄소 전원의 수급이 용이한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지 중 하나로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산업계의 감축에 있어 국가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핵심 요소이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인구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우리의 밀도는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나라임에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원자력 발전량이 많고, 8번째로 석탄화력 발전량이 많고, 9번째로 천연가스 발전량이 많고, 10번째로 태양광 발전량이 많습니다. 주요 발전원 5종 중 4종에 있어 '글로벌 Top 10'에 드는 것이죠. 지난 연재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인구당 발전량으로 봤을 때에도 원자력(3,649kWh/명)은 세계 4위, 석탄은 세계 5위(3,623kWh/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면적 대비 얼마나 많은 발전설비가 모여있는 것일까.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Top 10 국가의 발전량을 그 나라의 면적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면적은 국토부와 유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Top 10에 든 석탄과 천연가스, 원자력에 있어 '압도적 밀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발전원은 원자력으로, 1,000ha당 1만 9,365MWh의 전력을 생산해 절대적인 발전량 세계 1, 2위인 미국(연간 총 782TWh, 885MWh/1,000ha)과 중국(연간 총 445TWh, 472MWh/1,000ha)은 물론, 연간 원자력 발전량 상위 10개국 중 한국 다음으로 면적당 발전량이 많은 프랑스(연간 총 379TWh, 6,922MWh/1,000ha)와도 비교가 어려울 정돕니다.
석탄 또한 1,000ha당 19,160MW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세계에서 연간 1,000TWh 이상의 석탄발 전력을생산중인 '유이한' 나라인 중국(연간 총 5,864TWh, 6,222MWh/1,000ha)과 인도(연간 총 1,534TWh, 5,159MWh/1,000ha)는 물론, 이웃 나라인 일본(연간 총 326TWh, 8,944MWh/1,000ha)의 배를 넘습니다. 국토 1,000ha당 1만 8,238MWh의 전력을 생산한 가스화력발전의 밀도 또한 압도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천연가스 발전량 상위 10개국 중 면적당 발전량 2위의 일본(연간 총 347TWh, 9,520MWh/1,000ha)의 배에 가깝고, 자국 내에서 직접 가스를 생산하는 미국(연간 총 1,865TWh, 2,039MWh/1,000ha)과 러시아(연간 총 538TWh, 329MWh/1,000ha)는 물론, 이란(연간 총 311TWh, 1,917MWh/1,000ha)과 사우디(연간 총 265TWh, 1,233MWh/1,000ha)보다도 크게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의 밀도 또한 1,000ha당 3,381MWh로 연간 발전량 상위 10개국 중 가장 컸지만, 그나마 다른 전통 발전원에 비해선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작았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의 '고밀도'를 보이는 일본은 지난해 1,000ha당 2,798MWh의 전력을 생산해 이들 10개 국가 중 '밀도 2위'를 기록했고, 독일(2,032MWh/1,000ha)과 이탈리아(1,181MWh/1,000ha), 스페인(1,181MWh/1,000ha)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한된 자금과 제한된 땅, 그리고 제한된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화석연료의 밀도를 낮추고, 무탄소 발전원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해마다 발전량은 상황에 따라 증감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향성은 분명합니다. 바로, 발전원에 있어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화석연료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최근 15년간 주요 발전원별 전년 대비 발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석탄과 천연가스 발 전력생산의 성장세는 꺾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발전량 변화가 음수를 기록한 경우도 있을뿐더러,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더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원자력의 경우,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면서 성장세에 있어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존 전통 발전원과 달리 해마다 성장세가 커졌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값이 '양수'라는 것 자체가 '전년보다 발전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증가폭이 갈수록 커진 것이죠.
Ember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발전량의 변화폭이 컸던 10개 나라를 추렸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줄어드는 것도 함께 살펴본 겁니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중국(+110TWh)과 인도(+63TWh)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화폭이 컸던 곳은 미국으로, 발전량은 전년 대비 22.4TWh 감소했습니다. 한국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석탄 발 전력 생산은 17.7TWh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고요. 한편, 석탄 발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미국이지만, '본격적인 탈화석연료에 나섰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천연가스 발 전력 생산에 있어 미국은 2024년, 전년 대비 59T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며 세계에서 가스화력발전의 변화량이 가장 큰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변동폭이 컸던 나라로는 이집트(+15.1TWh)와 멕시코(+14.8TWh)뿐 아니라, 영국(-13.8TWh), 이란(-12.8TWh), 스페인(-12TWh) 등 발전량이 줄어든 곳들도 있었습니다.
무탄소 발전원의 경우는 어땠을까. 우선 원자력의 경우 가장 큰 폭의 변화량을 기록한 곳은 프랑스(+41TWh)였습니다. 이어 중국(+10.4TWh)과 한국(+8.2TWh), 일본(+7.4TWh) 순으로 변화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이 마무리되며 발전량이 전년 대비 7.2TWh 감소했고, 미국은 전년 대비 7.1TWh 늘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중국과 미국, 브라질이 성장세를 이끈 트로이카로 꼽혔습니다. 중국의 2024년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대비 250TWh 늘었고, 미국은 64TWh, 브라질은 23TWh 증가했습니다. 풍력의 경우, 중국 106TWh, 미국 32TWh, 브라질 12.3TWh의 증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발전원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태양광발전에 있어 최근 5년간 개별 국가별로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지난해 기준, 연간 최소 20TWh 넘는 전력을 햇빛으로 만들어낸 전 세계 15개국의 변화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소위 '탑 티어'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량 100TWh초과국으로는 중국과 미국, 인도,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2019년에도, 2024년에도 절대적인 발전량 기준으로는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4개국 중 발전량은 가장 적지만, 2024년 태양광 단일 발전원의 발전비중이 9.98%로 10분의 1에 달해 중국(8.28%), 미국(6.91%), 인도(6.5%)를 앞섰습니다.
2024년 기준 태양광 발전량이 50TWh를넘지만 아직 세 자릿수를 기록하진 못한 나라로는 브라질과 독일, 그리고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절대량 자체는 앞선 '탑 티어' 국가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자국 내 발전비중에 있어선 태양광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2019년만 해도 연간 6.65TWh의 태양광 발전량으로 발전비중 1.05%에 그쳤던 브라질은 2024년 74.68TWh로 그 양이 11배가 되면서 10.02%의 발전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의 태양광 발전비중은 2019년 7.54%로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2024년엔 14.89%로 더 높아졌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2024년 기준 연간 발전량은 58.6TWh로 브라질이나 독일보다 적었지만, 발전비중은 20.9%로 두 나라를 압도했습니다.
20TWh 선을 넘은 국가로는 호주(49.84TWh)와 이탈리아(35.81TWh), 한국(32.73TWh), 멕시코(27.55TWh), 베트남(25.85TWh), 튀르키예(25.67TWh), 프랑스(23.57TWh), 그리고 네덜란드(21.65TWh)가 있습니다. 이들 8개국 중 2024년 태양광의 발전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2019년 6.88%였던 비중은 5년 후 17.81%로 높아졌죠. 네덜란드 또한 4.5%에서 17.7%로 8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베트남(8.54%)과 튀르키예(7.52%)의 경우, 개도국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비중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4.23%)와 한국(5.26%)은 위 그래프에 담긴 15개국들 중 가장 낮은 발전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는 발전믹스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과의 대결구도를 내세우며 반박할 여지는 없습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Top10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1위, 782TWh)과 중국(2위, 445TWh), 일본(7위, 85TWh), 인도(8위, 55TWh), 스페인(9위, 55TWh)도 한국보다 더 많은 태양광 발전량과 더 큰 태양광 발전비중을 기록중이니까요. '국토 면적이 비좁으니까'라는 핑계 또한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면적당 발전량은 석탄도, 천연가스도, 원자력도 주요 선진국 또는 개도국 대비 '압도적 1위'로 높은 밀도를 자랑하고 있고, 그나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밀도는 그나마 '덜 압도적인 1위'인 상태니까요.
무의미하고도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논쟁은 젖혀두고, 모두가 함께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유연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력 수요에 공급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맞출 것인가, 수요의 지나친 변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가격 신호를 이용한 가장 원초적인 수급 조절부터 DR(Demand Response, 수요 반응)과 같은 좀 더 세련된 정책적인 대응과 양수, BESS, 플라이휠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유연성 자원의 투입, 고도화한 관측장비와 AI 기술을 접목한 모델링 설계를 통한 수요 및 공급 예측의 속도와 정확도 개선 등 실체적인 '행동'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